“무책임 삼성-무능 지자체, 주민간 갈등만 키워”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태안 주민들에게 천문학적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공동체 붕괴’라는 또 다른 아픔을 안겨줬다.
기름유출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태안 서쪽의 작은섬 ‘가의도’. 이 작은 섬을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가지가 잘려나간 450년 된 은행나무가 지키고 있었다.

1박 2일 일정으로 찾은 가의도에서 ‘논개 취재팀’은 기름유출사고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1월 20일자 <태안 최대 피해지 ‘가의도’, 그날 이후 23%가 암환자> 기사 참고)를 들을 수 있었다.
주민들은 가의도에 기름유출 피해가 집중됐음에도, 단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정부나 언론의 관심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피해 상황이 부각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실제로 가구당 수백만원의 긴급자금이 지원된게 전부다. 암환자는 물론 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의료 지원도 턱없이 못미친다.
이상호 기자와 go발뉴스 취재팀은 태안 지역 취재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가의도 곳곳을 돌며 사고 이후의 오염복구 상황도 현장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점은 역력했으나, 빈집과 생기를 잃은 섬마을의 참상이 가의도에 대한 육지의 무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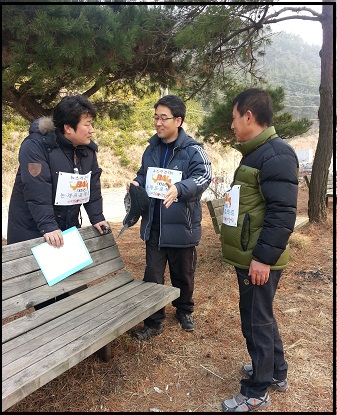
실제로 지난해 12월, 박상규 태안군 기획감사실장이 ‘대형 재난지역의 갈등관리에 관한 실증 연구’를 위해 태안지역 주민 76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6.5%가 ‘기름유출 사고 이후 지역민들의 갈등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답했다.
강 의장은 이렇게 된 데에는 ‘삼성의 분열주의적 지역공략’과 ‘지자체의 미흡한 대응’ 그리고 ‘소득 감소와 생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확산’이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피해주민들이 긴급 생계비를 지원 받는데 있어 “긴급 생계비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긴급 생계비가 각 마을별로 전달됐는데 생계비 기준이 딱히 없다보니 같은 업에 종사하더라도 마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류광준 홍보국장은 “배나 어장이 있는 주민들은 증거가 있어 보상을 받았지만 맨손 어업을 하는 주민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일반 국민들은 이미 보상 받았다고 알고 있지만 가해자가 있는데도 불구, 보상도 못 받고 하소연 할 곳도 없다”면서 “정부, 지자체 등이 대책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해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리포를 거쳐, 천리포, 기름유출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의항까지 6.3km를 ‘논개 취재팀’과 함께 걸었다.
이상호 기자는 "짧은 거리를 걸으며 인터뷰를 나눠본 적은 있지만, 긴 길을 걸으며 인터뷰를 하니 보다 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둘러본 태안은 5년 전에 비해 자연환경은 예전 모습을 되찾은 듯 보였다. 당시 기름유출 사고로 주 소득원이었던 굴 양식장이 철거되면서 자연스럽게 바지락이 갯벌에 서식하게 됐고, 이제는 바지락이 태안 일부 지역의 주 소득원이 됐다.
문성호 의항2구 어촌계장은 “자연환경이 예전 수준으로 복원되어 관광지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적 환경은 아직까지도 70~80년 대 수준으로 낙후되었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태안 주민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만 대처했어도 피해보상 문제는 물론, 주민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태안 사태가)연례 행사처럼 여겨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 동시, "피해 주민들에게 귀기울이고, 고통을 함께 나눠달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